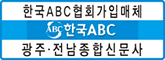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기자 천국" 나주시, 나주시청 출입기자 233명
흔히들 기자는 사초(史草)를 쓰는 현대의 사관(史官)이라고 말한다. 폭군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준엄한 글발을 다듬는 차가운 무리들이다. 과연 그런가.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언론인이라 칭해지는 인사들 중에서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을 본업으로 하는 지역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부실은 그 권력을 안하무인하게 만들어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나주권력에 대해 '심기 저널리즘'과 '이심전심 저널리즘'으로 타락했다는 지적 앞에 자유스러울 수 없다. 나주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와 논평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카르텔이 이심전심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회의 등불이라는 언론인의 변절, 부화뇌동, 사이비 행위는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절개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가치 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언론은 타 직업군보다 고도의 직업의식이 요구되는 직업군이다. 나주 지역 언론의 현실은 다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른바 그레샴의 법칙이 불행하게도 지역 언론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신문의 질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질에서도 그렇다. 지역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긴 놈이 내편이다‘라는 비즈니스적 사고로 새로운 나주권력에 편승해 감시와 견제는커녕 먹이를 찾아 곡필과 혹세무민을 일삼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지역 언론을 ’대표‘하고 있다.
나주시에 의하면 7월말 현재 나주시에 출입을 신청한 기자, 즉 취재차 시청을 오가는 기자가 233명이라고 한다. 기자가 많다는 것은 대충 알았지만 이 정도인줄은 상상을 못했다. 내가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20여명 안팎이었는데 233명이라니 기자 천국이다. 긍정적으로 봐와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30여년 가까이 지역 언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답이 궁색하다. 나주 시내에서 앞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기자님’하고 부르면 두서너 명은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성 싶다.
‘책대로’해석하자면 나주시에 기자가 많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기자 수에 비례해 알권리 충족이라는 혜택을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나주시 공직자나 나주시민이 바라보는 지역 언론인에 대한 시각은 솔직히 긍정적이지 못하다. 여론조사 같은 것 등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여러 계층의 지역민들과 나눈 대화(지역 언론 관련해)를 종합해 보면 수의 많고 적음은 별개로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이다. 자업자득이겠지만 대부분이 기레기(기자+쓰레기) 취급이다.
며칠 전 모 공직자와 술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다. “무슨 놈의 신문과 기자가 그렇게 많은지, 이름도 생소한 신문부터 인터넷매체까지 이놈 저놈 들락거리며 으스대는 기자님 행세에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다. “취재차 들렀겠지”라고 옹색한 답을 했지만 공직자 말이 가관이다. “취재는 하는데 기사는 거의 보지도 못했다”며 “가끔 보도되는 기사 대부분은 나주시에서 생성한 보도자료 일색이고 창작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더 웃기는 것은 관의 홍보용 보도 자료를 자기가 작성한 기사인양 기명으로 올리는 뻔뻔한 기자가 대부분”이란다. 200명이 넘는 기자 중에서 손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나주언론의 현주소”라고 못을 박아 버린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못했다. 다소 적나라하게 대화 내용을 옮겼지만 딱 부러지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 언론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나주시 공직자다. 그런 공직자의 입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은 작금의 지역 언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지역 언론인과 가장 많이 부대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직자 말의 신빙성에 방점이 찍힌다. 지역 언론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터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지역 언론을 지역사회의 개혁대상 선순위에 올린 지 오래다. 지역 언론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국민대중의 요구를 권력이 모르쇠 할 때, 그 매개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언론인데 지역 언론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 언론으로서의 ‘감시견’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레기 취급을 받는다. 기실 지역 언론과 감시견을 연결 짓는 것조차 ‘우스개’가 될 판이다. 감시견은 언론의 본분이며, 보도와 논평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언론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를 쇠고랑 채 운 것은 검찰도 의회도 아닌 언론이었다. 문예춘추(文藝春秋)에 실린 다치바나 다카시의 깊이 있는 취재가 결정타였다. 재선으로 승승장구하던 닉슨 대통령을 사임케 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〱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 번스타인 두 젊은 기자의 보도 때문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인 화이트워터 사건도〈뉴욕 타임스〉의 제프 커프 기자의 보도가 시발점이 됐다.
언론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직필(直筆)이다. 언론인은 직필하면 된다. 권력이 부패했으면 부패했다고 쓰면 되고, 권력이 부정을 했으면 부정을 했다고 직필하면 된다. 지역사회에 기자의 숫자가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직필하는 기자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다. 233명의 지역 언론 종사자들이 나주시 공직자나 지역민들로부터 기레기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불편부당의 원칙은 옳고 그른 것, 정의와 불의를 추상같은 엄격함으로 가리는 것을 뜻한다. 233명의 지역 언론인들이 그와 같은 직업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역민들로부터 ‘기레기 졸업장’은 받기가 어렵다. 언제까지나 ‘기레기’라는 세 글자를 이마에 새기고 다니기 십상이다.
물가에 가지 않으면 목을 축일 수가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익사 할 수 있다. 언론인과 권력은 불가근불가원이다. 언론인은 권력의 영원한 아웃사이더이어야 한다. 권력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펜을 버려야 한다. 다른 직업도 아닌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들이 밖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일삼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언론인이라는 직업정신을 잃었을 때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은 죽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