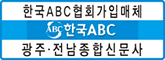순위와 평점, 후기가 여기저기 넘치는 세상이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면 제품평부터 서비스 이용 후기에 이르기까지 순위와 평점을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가 돈과 시간을 낭비해 불행해지더라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물건 사기 전에, 돈 쓰기 전에 평점, 후기 열심히 읽고 꼼꼼히 비교하는 데 들인 시간과 행복이 비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이 있다. 결국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측면을 꼼꼼히 비교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싼값에 사고 나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데 들이는 품과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에는 유명한 음식 비평가 피트 웰스(Pete Wells)가 고른 최고의 식당 목록이 ‘2023년 뉴욕 100대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하게 실렸다. 시간이 되면 외식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기사 링크를 저장해 뒀다가 얼마 전에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 한 곳을 찾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실망스러웠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식당 분위기도 밝고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음식 맛이 별로여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던 걸까? 그저 나의 입맛에 안 맞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나에게 좋은 평을 못 받았을 뿐 그 식당은 여전히 지금 뉴욕에 살거나 뉴욕을 찾는 사람들이 꼭 가볼 만한 훌륭한 식당일 거라고 생각한다.
맛집이든 물건이든 가이드 투어든 추천 없이는 무언가에 돈을 쓰기가 꺼림칙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추천이 나한테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히 순위나 평점, 추천을 탓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천차만별인 식당들에 과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순위를 매길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어쩌면 순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굳이 순위를 매기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억지로 순위를 매기는 세태가 문제 아닐까?
작가 레이첼 코놀리는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우선 고려돼야 할 사안에마저 ‘객관적인 순위’를 매기는 세태를 꼬집는다.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전자기기나 장난감, 자동차 등 수많은 상품이 그렇다. 식당이나 카페에 관해서도 가격이 얼마인지, 공간이 얼마나 넓고 의자가 몇 개 있으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맛에 관한 평가나 분위기에 대한 감성, 직원들의 서비스에서 받은 인상등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가를 모아 매긴 순위를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일 때가 많다.
행복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주관적이라는 건 곧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뜻이며 그 기준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개인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단단해진 결과물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순위에 아무리 맞춰봤자, 내가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뉴욕타임스 비평가 피트 웰스가 꼽은 100대 레스토랑에 다 가본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닐 것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행복을 가늠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흐려진 것일지 모른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기준에 집착하며 역설적으로 불행해 질수도 있다.
무언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영어 약자로 ‘FOMO(Fear Of Missing Out)’라고 한다. 주식 등 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각종 트렌드에 뒤처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다.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도 ‘포모’ 개념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도 행복을 억누르고 불행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디 어디 여행 가서 이 식당 안 가봤다면…” 따위의 문구이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그 정도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든 자기 스타일에 맞춰 시간을 보냈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자기 스스로 내리면 그만인데 말이다.
세상에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참 많지만, 아마도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 또는 순위를 매기는 게 무의미한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앞서가거나 뒤처진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인 것에 억지로 순위를 매기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다.
인용원문: The Tyranny of ‘the Best’, By Rachel Conno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