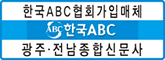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는 정치 사조가 태동한 건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미국의 독립과 건국이나 프랑스혁명이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내세운 새로운 사상을 반영한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련의 자유주의 혁명, 운동이 추구하던 자유란 압제로부터의 자유였다.
압제란 전제 군주이기도 하고, 교황과 성직자의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종교이기도 했었다. 유럽 근대국가 안에서는 신분제가 약화했고, 미국은 처음부터 헌법에 전제 군주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영향력이 커졌고, 정치적으로 신민 아닌 시민이 등장한다.
다만 이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추구한 자유는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성은 전제 군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범주 밖에 있었고, 군주 없이 평등한 사회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른 인종을 노예로 부리던 노예 소유주였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는데, 자유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끌어안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대신 산업혁명으로 크게 불어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기존의 전제 군주나 토착 기득권 세력을 끌어내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자유주의가 이용되었다. 피식민지 사람들은 겉으로 자유를 앞세운 제국주의 세력에 자유를 빼앗긴 셈이다.
전 세계에 식민지로 삼을 만한 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서구 열강들끼리 두 차례 큰 전쟁을 벌인다. 이때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들의 주적은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앞세운 나치 독일이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일본 제국이었다. 자유주의 세력은 혁명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파시즘과 싸웠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바뀐다. 모인 교수가 칼럼에 썼듯이 냉전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파시즘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적으로 변하는 시대”의 도래이기도 했다. 이제는 적이 된 상대방의 잔재를 소탕한다는 명목하에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자유를 많이 축소하고 억압한다. 말의 뜻부터 자유주의와는 지극히 모순일 수밖에 없는 ‘사상 검증’이 그야말로 기승을 부린 시대가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1950년대였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사람들이라면, 매카시즘의 광풍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다른 이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수호하는 투사라고 하던 시절이다.
모인 교수는 오늘날 자유주의가 탄탄한 철학적, 사상적 근거를 잃고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냉전 시대에서 찾았다. 전제 군주, 종교 등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던 소극적 자유에서 어떤 대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다른 이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해 나가야 했던 시점에 냉전이 오면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 자유주의는 우리 안의 적인 공산주의를 색출해 척결하는 극단적인 억압의 기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잇따라 개혁, 개방 노선을 택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주의자들은 잽싸게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수십 년간 벌여 온 경쟁에서 이겼으나 이때야말로 냉전이 끝난 시점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철학적, 사상적 기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인 교수가 또 한 번 안타까워하듯 우리는 “자유주의 사상이 지닌 해방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데 소홀했다. 사실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창한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더 아쉽기도 하다.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계급 해방을 내건 자유주의의 약속을 크게 진척시킨 정책이었다.
자유주의는 냉전 시대를 거치며 잔뜩 왜곡되고 망가진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탈냉전 시대에는 ‘철 지난 색깔론’을 들먹인다는 비판이라도 받았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들어서는 노골적인 색깔론이 더 버젓이 활개를 치는 듯하다.
색깔론은 어김없이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권한을 독점한 채 다른 이의 자유를 끝없이 억압하는 이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한 자유주의의 쇄신은 요원해 보인다.
인용 원문 :
Can Liberalism Save Itself?,
By Samuel Moyn
조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