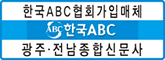새해 결심의 계절이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은 새해 결심의 단골 메뉴이다. 그 가운데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자주 포함되곤 하는데 체중 감량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말이 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고 음식 생각이 나는 본능적인 식욕에 따른 반응을 지워내야 할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소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넬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철학자 케이트 만이 배고픈 현상을 ‘음식 소음’으로 부르며 억제하려는 세태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극복하려다 자기 소외를 자초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칼럼의 일부이다.
202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던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단어를 요즘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틱톡에 “음식 소음이란 무엇인가” 관련 영상들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더하면 18억 회에 이른다. 지난여름에 이 정도였으니, 지금은 숫자가 더 커졌을 거다.
‘음식 소음’이란 음식 생각을 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며, 이따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일을 포함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식욕, 배고픔, 식탐 등을 좀 더 세련되게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식욕이나 식탐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기보다 어딘가 고장 난 것, 잘못된 문제 취급을 받는다.
무언가를 ‘소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서는 규범적 판단이다. 그저 음식을 사랑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즐거움, 배고픔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자연스러운 본능에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 지나치다.
체중이 줄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 이들에겐 식욕을 억제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약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더라도 체중 감량이 무조건 건강과 직결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배고픔의 신호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다이어트 문화를 비판하는 글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볼 땐 배고픔 자체를 무시하고 억제하려는 생각도 문제다.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극복하려다 자기 소외를 자초한다.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은 우리에게 온갖 신체적 명령을 동원해 무언가를 먹으라고 말한다. 음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부르짖음과 요구, 간청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건 결국 동물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자, 인간성을 지워버리는 행위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음식은 우리와 우리 자신을, 나아가 다른 이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이런 소중한 매개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억눌러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가르치는 문화는 분명 이롭지 못하다.
물론 ‘음식 소음’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음식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폭식 등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영양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은 “음식 소음은 당신이 식욕을 해소할 만큼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지나친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문화가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한다.
식욕 자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시선은 더 넓은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이는 온 사회가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부정하고 외면하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카페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약효가 오래가는 약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수면욕을 억지로라도 이겨내야 하는 세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피로나 피곤함이 아니라 피곤하고 졸린 상태를 ‘수면 소음’이라고 부른다. 몸의 신호에 굴복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억지로 부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이 치료제로 인기를 끈다. 피곤하면 쉬자는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를 지워내야 할 소음으로 간주하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더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수면욕을 식욕으로, 피곤함을 배고픔으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약물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과 식욕을 넘어서는 미래를 둘러싼 현기증 나는 논의들은 배고픔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자 싸워온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준다. 또한, 우리 중 누구도 음식이 주는 편안함과 기쁨, 즐거움을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물론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먹기 위해 사는 행위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넘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이바지했음을 잘 안다. 음식 소음은 병적인 것이나 약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음식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추는 법을 익히는 편이 낫다.
What if ‘Food Noise’ Is Just… Hunger?,
By Kate Manne
조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