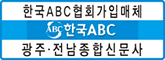정부는 쌀 과잉 문제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논에 벼 대신 콩, 밀, 가루쌀을 심으면 직불금이라는 당근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부담과 위험은 농민들 몫이었다. 정부의 신호에 따라 벼농사를 접고 콩과 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민들은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고 소비처나 시장 기반은 부족하다 보니 애써 키운 작물이 창고에 쌓여 버리는 현실이 적잖다.
정부는 쌀 과잉 문제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논에 벼 대신 콩, 밀, 가루쌀을 심으면 직불금이라는 당근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부담과 위험은 농민들 몫이었다. 정부의 신호에 따라 벼농사를 접고 콩과 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민들은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고 소비처나 시장 기반은 부족하다 보니 애써 키운 작물이 창고에 쌓여 버리는 현실이 적잖다.
현장의 농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벼를 줄이고 콩과 밀을 심으라 해서 따랐더니, 이내 직불금 축소나 재배면적 감축을 이야기한다. 농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이 줄줄이 깎이면 농민들은 소득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밀·가루쌀 재배 농민은 “직불금 단가는 늘었지만 농사짓는 노하우도 부족하고, 수매가격이나 판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투자하여 생산을 늘렸지만, 제대로 된 소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창고에 전략작물이 방치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입산 곡물이 국산보다 훨씬 싸게 풀리면서, 농민 입장에선 ‘헌신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든다. 결국 “생산 확대보다 판로와 소비처 확보가 우선”이라는 농민 목소리가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정책이 반복되면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 수치만 쫓는 정책은 결코 농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농민의 땀과 밥상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지원금만 늘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안정적 판로, 실효성 있는 수매보장,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 중심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